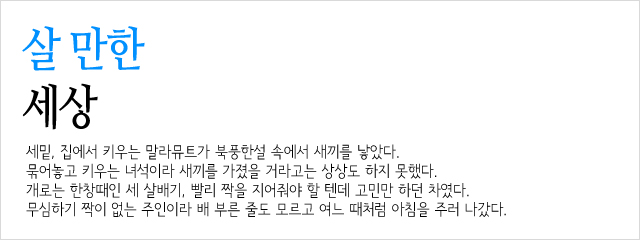
 세밑, 집에서 키우는 말라뮤트가 북풍한설 속에서 새끼를 낳았다.
세밑, 집에서 키우는 말라뮤트가 북풍한설 속에서 새끼를 낳았다.
묶어놓고 키우는 녀석이라 새끼를 가졌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개로는 한창때인 세 살배기, 빨리 짝을 지어줘야 할 텐데 고민만 하던 차였다. 무심하기 짝이 없는 주인이라 배 부른 줄도 모르고 여느 때처럼 아침을 주러 나갔다. 먹을 것만 보면 환장하던 녀석이 웬일로 낙엽더미 속에 엎드려 가만히 쳐다보기만 했다. 살펴보니 배 밑에서 뭔가 꼬물거리고 있었다. 닭이며 날아가는 나방이며 개구리며, 사냥에 일가견이 있는 녀석이라 들짐승을 잡은 줄만 알았다. 그런데 새끼였다.
제 집을 놔두고 집 뒤안 바위를 잠자리로 고집하는 녀석이었는데 바위에는 낳을 수가 없어 푹신한 낙엽더미 안에서 출산을 한 모양이었다.
부랴부랴 개집에 짚을 깔고 담요도 넣고, 방한용 비닐로 바람 들어갈 틈 없이 막았다. 새끼를 이동시키면 아무리 주인이지만 공격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녀석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표정으로 내 뒤를 졸졸 따라왔다. 밤낮 집을 비우는 무심한 주인인데도 녀석은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준 것이다. 개집을 죽어라 거부하던 녀석이라 새끼들을 다시 낙엽더미로 옮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쓸데없는 기우였다. 제 취향보다는 새끼가 우선이었다. 녀석은 새끼 잘 키우는 교육이라도 받은 듯, 첫 출산임에도 불구하고 새끼를 정말 잘 돌보았다. 새끼들은 스스로 배변을 하지 못해 어미가 핥아주어야만 된다는 것도 녀석 덕분에 처음 알았다. 녀석은 때 되면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새끼들을 주둥이로 밀어 젖을 먹이고, 똥오줌을 핥아먹고, 새끼들을 퉁실퉁실 잘도 키워냈다.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참으로 기특했다.
옆집 사는 아저씨는 우리 개를 유독 싫어한다. 저런 개는 잡아먹어봤자 맛도 없다는 이유다. 긴 털 때문에 여름이 죽을 맛인 우리 개는 여름마다 눈병을 앓는다. 덩치가 큰 개라 아저씨 트럭으로 두어 번 병원에 갔는데 그때마다 개 따위는 그냥 놔두면 알아서 다 낫는데 쓸데없이 돈 쓴다며 두고두고 잔소리가 늘어지는 아저씨다. 그런 아저씨가 바람 덜 부는 데로 개집 옮기는 것을 기꺼이 돕고, 볏짚을 가져다주고, 방한용 비닐을 구해 왔다. 그리고는 새끼 낳느라 수고했다며 돼지고기 두 근을 삶아왔다.
이런 게 사는 거구나, 우리 개와 옆집 아저씨가 번쩍 내 눈을 뜨게 했다. 때 되면 새끼를 낳고, 새끼를 위해 제 취향쯤 기꺼이 포기하고, 제 몸 부서지는 줄 모르고 새끼를 돌보고, 그것을 어여삐 여기는 마음, 먹어도 되는 한낱 미물이라 생각했지만 기꺼이 고생했다 칭찬하고 보상하는 마음. 사는 게 별것이랴. 사람들이 제각기 그만큼만 하고 살아도 살 만한 세상이다. 단순한 데 진리가 있다. 솔직한 데 답이 있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대로 제 도리를 다하고, 그것을 당연히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면 그만이다.
새해 첫날, 사람들은 대부분 한 해의 계획을 세운다. 자신을 뒤돌아보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진 까닭이다. 새해 첫날부터 세상을 욕하고 탓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굳은 다짐은 물거품이 되고,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는 대신 주위를 탓하고 세상을 탓한다.
새해 첫날의 소박한 반성과 다짐을 한결같이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공자가 말한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 :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식은 자식답게·<논어>)의 경지요, 세상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치다.
글·정지아(소설가) 2014.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