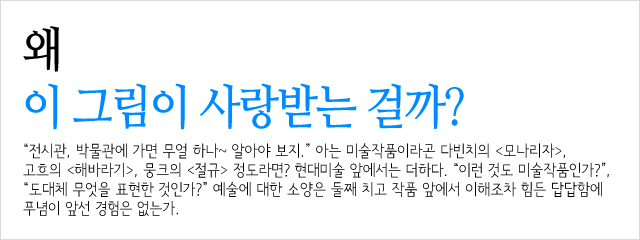
 “전시관, 박물관에 가면 무얼 하나~ 알아야 보지.” 아는 미술작품이라곤 다빈치의 <모나리자>, 고흐의 <해바라기>, 뭉크의 <절규> 정도라면? 현대미술 앞에서는 더하다. “이런 것도 미술작품인가?”, “도대체 무엇을 표현한 것인가?” 예술에 대한 소양은 둘째 치고 작품 앞에서 이해조차 힘든 답답함에 푸념이 앞선 경험은 없는가.
“전시관, 박물관에 가면 무얼 하나~ 알아야 보지.” 아는 미술작품이라곤 다빈치의 <모나리자>, 고흐의 <해바라기>, 뭉크의 <절규> 정도라면? 현대미술 앞에서는 더하다. “이런 것도 미술작품인가?”, “도대체 무엇을 표현한 것인가?” 예술에 대한 소양은 둘째 치고 작품 앞에서 이해조차 힘든 답답함에 푸념이 앞선 경험은 없는가.
블록버스터형 미술 전시가 개최되고 곳곳에 대규모 미술관이 새로 문을 여는 등 점점 고조되는 미술 열기에 동참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한 책이 나왔다. 훌륭한 미술 책 가이드인 동시에 미술 입문을 돕는 완벽한 이정표다.
“모딜리아니의 갸름한 얼굴 그림이 줄곧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는? 옛 거장들은 사진 없이 어떻게 ‘완벽한 그림’을 그렸을까?” 등 미술 교양을 아우르는 62권의 방대한 자료가 한 권에 담겼다. 미술 이론가인 저자는 고흐, 고갱, 피카소 등 거장들의 일생과 곰브리치, 에코 등의 서양미술사에 대한 통찰력 있는 해설을 풍부하게 망라했다.
20세기 거장 피카소에 대한 분석을 예로 들어보자. 피카소는 동시대 미술시장이 활성화하는 20세기 초 입체주의를 탄생시키며 부와 명예를 누렸으나, 유명해진 뒤 ‘세속주의적 예술’로 돌아가는 분위기 때문에 기념비적인 작품을 내지 못했다. 여기에서 “예술의 영감은 역사에 있다”고 지적한 존 버거의 글을 지목해 오늘의 미술계를 되돌아본다.
글로 미술을 배우기는 지루하다. 이에 86장에 이르는 화보는 미술 공부의 재미를 더한다. 친절한 설명으로 머릿속에 각인되는 정보들은 근처의 미술관으로 향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한다. 소개된 미술 명저들과 작품을 음미하다 보면 4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 많게 느껴지지 않는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역시 한국미술사다. 최근 우리의 미술교육과 미술시장 전반이 서양미술에 치우쳐 있는 것을 고려하여 한국미술 서적도 꼼꼼히 살폈다. 이 책은 “한국의 미감은 무엇인가? 한국미술의 뿌리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그동안 우리가 간과해온 한국미술이야말로 더욱 발굴하고 성찰해야 하는 새로운 ‘미감’이라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늣늣하고도 희떱고 희떠우면서도 익살스러운”과 같은 표현으로 한국의 아름다움을 묘사한 최순우의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에 대한 이야기가 흥미롭다.
미술을 사랑하는 사람은 물론 막연히 교양 초심자로 미술을 알고 싶은 사람도 이 책을 읽어야 한다. 이제 “우와, 멋있다~”의 감탄사로 그치는 관람은 멈출 때도 됐으니 말이다.
글·박지현 기자 2014.07.14
단신
<엔지니어의 인문학 수업>
새뮤얼 플러먼 지음 | 김명남 옮김 | 유유
1만6천원
‘통섭’하고 ‘융합’하는 균형 잡힌 인간이 되려면 인문학이 필요한 걸까? 여러 권의 전작을 통해 인문학과 공학의 결합을 설파해 온 저자는 이 질문에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엔지니어에게는 인문학이 필요하다”고 답변한다. 각 분야로 들어가는 머리말에서 엔지니어와 해당 분야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엔지니어라면 어떤 식으로 그 분야를 이해할 수 있을지 등을 설명하며 엔지니어가 엔지니어라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인문학을 소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조심>
정민 지음 | 김영사 | 1만4천원
‘마음을 붙드는’ 고사성어들로 엮은 책이다. ‘조심’은 바깥을 잘 살피라는 의미로 쓰지만 원래는 마음을 붙든다는 뜻이다.
마음의 주인이 되라는 말과 같다. 저자는 ‘지유조심’에서 ‘소년청우’에 이르기까지 네 글자의 행간에 오롯이 담긴 묵직한 100편의 글을 담았다. ‘몸가짐과 마음공부’, 시‘ 비의 가늠’, 세‘ 정과 속태’, ‘거울과 등불’ 등 네 갈래로 나누어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과 원칙이 흔들리는 세상을 향해 소개한다.